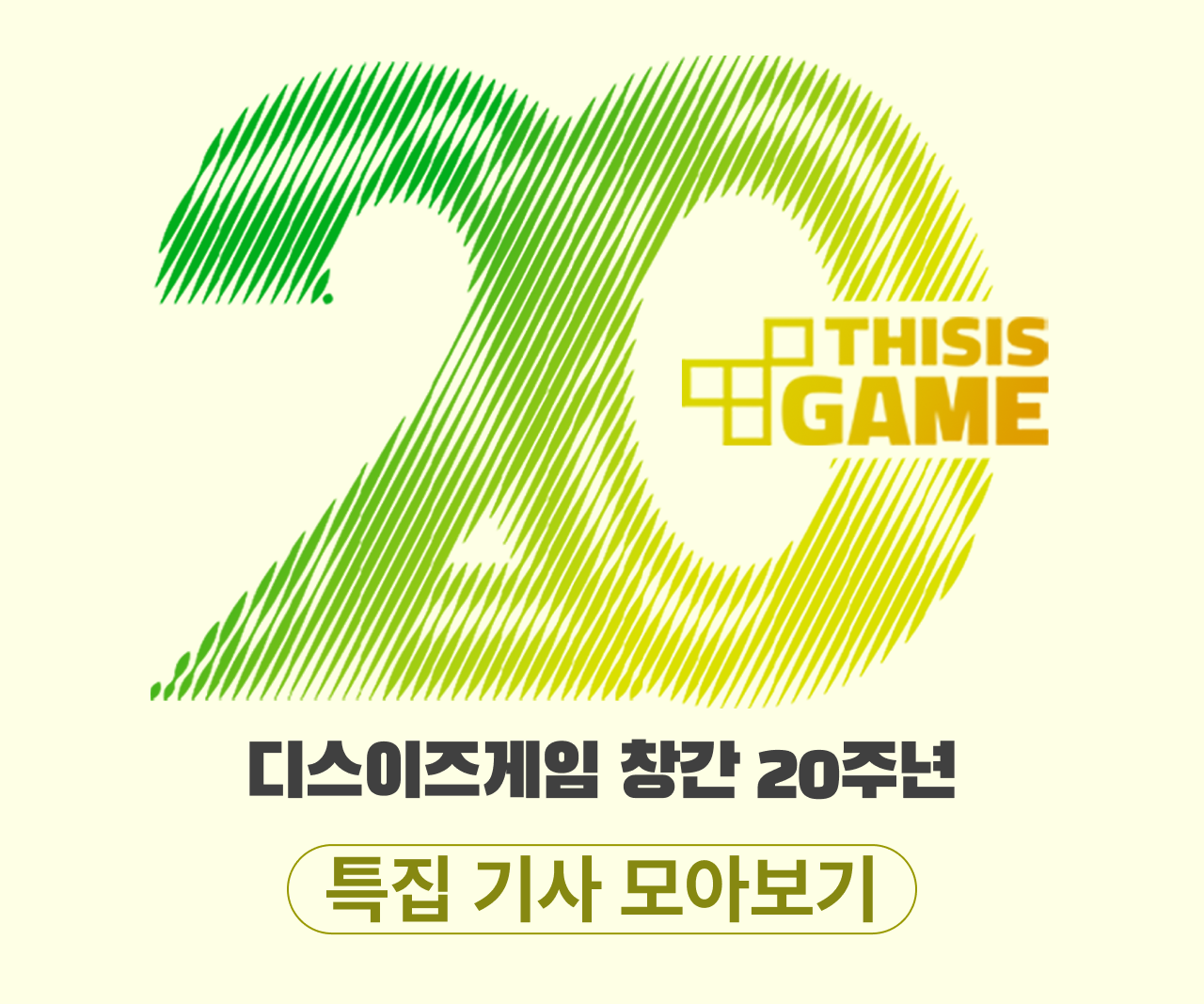게임 중독 정말 중독?
몇 일전 게임중독 중학생의 패륜사건으로 각종 신문 방송에선 연일 게임 중독에 관련된 특집을 내보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G스타 기간과 겹치면서 사회적인 시각이 어디로 갈지라는 걱정도 된다. 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게임 중독에 대한 대책을 보면 단순 심리치료에 국한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중독자라 말하는가?
우습게도 그들이 말하는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 도표일 뿐이다. 하루 몇 시간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다가 밥을 거른다. 혹은 잠을 안자는 것을 체크해 그 빈도가 높다면 중독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런 단순 단어에 의한 데이터는 책, 영화, 비디오 등 어디에나 대입할 수 있는 데이터다.
패륜사건에서도 중독이라 하며 게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만 그 사건에서도 그런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내면의 이유를 봐야되는 게 아닐까?
어떤 시대이던 시대를 선도하는 미디어라는 건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책이 그랬고 영화, 음악, TV,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가 각종 범죄에 의한 핑계가 되고 있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사람중 게임을 안해본 사람의 빈도가 얼마나 될까?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뺀다면 간단한 게임이라도 한번 쯤 해 봤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게임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공감대라는 것이다.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재밌는 건 기사에서 말하는 중독현상을 보면 '어 나도 그런 적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 심리학에선 바넘효과라고 명명하고 있다. 바넘효과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 '을 말한다.
이 효과는 점을 볼때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키워드를 말하면 자연히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게임 하느라 밥을 안먹었다면 중독'이라 하면 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그럼 내가 중독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다.
내 생각에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건 게임이 아니라 가정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패륜 사건을 자세히 보면 부모님의 이혼, 불안한 가정과 같은 부분이 빠져 있다.
즉 가정사의 문제다. 쌓이고 쌓인 집안의 문제에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어린나이에 어른의 사정으로 인한 아버지와 결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아이들의 심리상태는 어땠을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장 편한 게임으로 빠져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부모에게 자신이 안주하는 곳을 부정당하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게임 중독은 있을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에 중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조차 중독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일 중독, 공부 중독, 책 중독 등등이 말이다.
쓰다보니 이리저리 두서없이 썼지만 요는 그거다. 게임 유저를 곱게 보지 않는 사회를 좋게 보도록 바꾸기 위한 유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제발 채팅으로 욕 좀 하지 마세요. 라는 것도 하나의 범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끚!
-
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
[비밀글] 누구누구님께 삭제된 글입니다 블라인드된 게시물입니다 [내용 보기] 댓글을 로딩중이거나 로딩에 실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