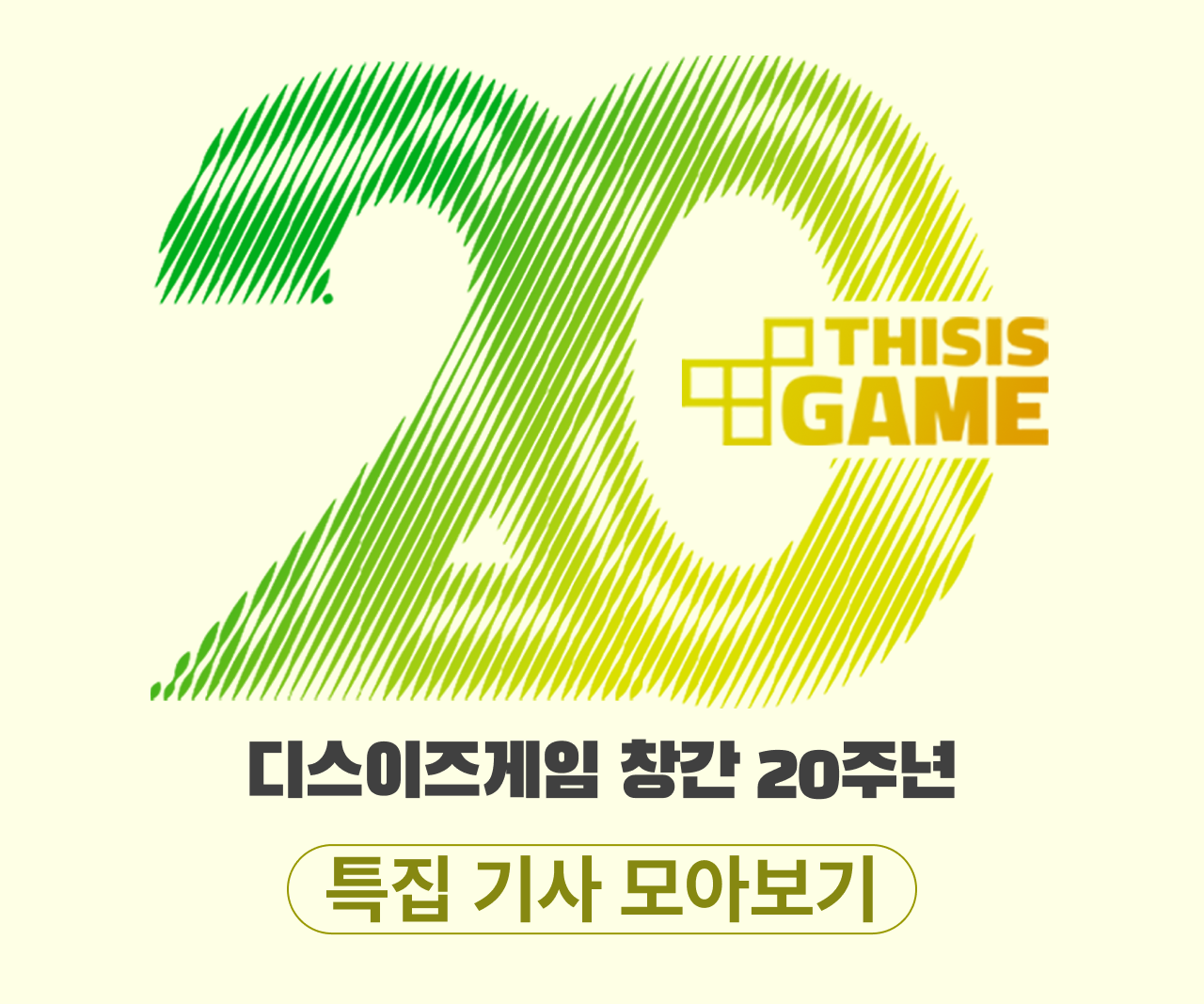"게임 개발의 비전문가 시대가 오고 있다"
[알림]
이 기사는 게임 디벨로퍼와 기사제휴를 통해 번역 및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외신 '게임 디벨로퍼'의 브라이언트 프랜시스(Bryant Francis)는 16일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했다. '비디오게임의 탈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 of video games)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팍스 이스트를 취재한 소감이 담겨있다. 그는 현장에서 한 마케팅 전문가 라이언 K. 리그니를 만났고, 기존의 "전문화된" 게임 개발 인력들이 업계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용은 이렇다. 팍스 이스트에서는 디볼버나 펀컴, 비헤이비어 인터랙티브가 부스를 냈지만, 대부분의 부스는 1인에서 3인 개발자의 게임이 전시되어 있었다. 소규모 팀들과 인디 퍼블리셔가 부스를 낸 것이다. 프랜시스는 코로나19 이후 게임사들이 전시장에서 물러났고, 마케팅 방식이 변화한 것을 지적했다. 그가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팀은 3인 이하였고, 많은 개발자가 단기 외주 계약자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전과 달리 썰렁해진 현장에서, 프란시스는 ⓐ F2P 게임이 성과를 내고 ⓑ 대형 스튜디오들이 판매 부진을 겪는데 ⓒ 소수 개발자가 성공하며 "탈전문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먼저 사라질 직군은 마케팅일 것이다. 다음은 경영진이 ‘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모든 직군"이라고 경고했다. 비정규·불안정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일부는 업계를 떠날 수 있다는 경고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에 강한 좌절감을 토로한다.
탈전문화가 가속되면서 게임개발의 노동 가치가 저하되고 있고 아티스트, 작가, 사운드 디자이너의 지위를 '어셋 제작자' 수준으로 격하시켜 "그들의 창의력을 존중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GDC 2025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해고된 개발자의 19%가 내러티브 직군에 속해 있었다. AI와 해외 아웃소싱이 그럴듯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면서 핵심 개발자로 분류되던 이들이 "부가 서비스 제공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게임 디벨로퍼의 우려인 것이다.
리그니는 "대형 스튜디오가 창의적인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탈전문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므로 "조직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란시스는 "이제는 누가 멋진 게임을 만드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이 탈전문화의 흐름이 누군가에게 1인 창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의 구조조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을 직접 해고한 경우가 있고, 스튜디오를 분사시킨 경우가 있으며, 아예 회사의 문을 닫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 빈 자리를 파고든 것은 칼럼에서 소개한 '아웃소싱과 생성형 AI 기술'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발라트로>나 <스케줄 I> 같은 1인 개발 게임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관련 기사]
1인 개발자의 시대 (바로가기)
게임 디벨로퍼는 '가마수트라'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게임 개발자'로 자기 제호를 바꿀 만큼 개발자 권익에 관심이 많은 매체로 알려졌다. 이곳은 매년 GDC 산업 리포트 발간에 참여하고 있고, 북미의 게임 노동조합 동향에 관해서 제일 열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 매체가 게임 산업의 탈전문화와 게임 개발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실태에 이른 것이다.
여전히 '올해의 게임'에 회자되는 AAA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이프라인과 그를 지탱할 개발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케팅에서 시작된 감축이 게임개발 전 분야에 퍼진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 수단을 잃거나 정규직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혼자서 스팀에 도전장을 내밀어 대박을 낼지 몰라도, 단기 계약직이 된 사람들은 노동 가치의 저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디스이즈게임
디스이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