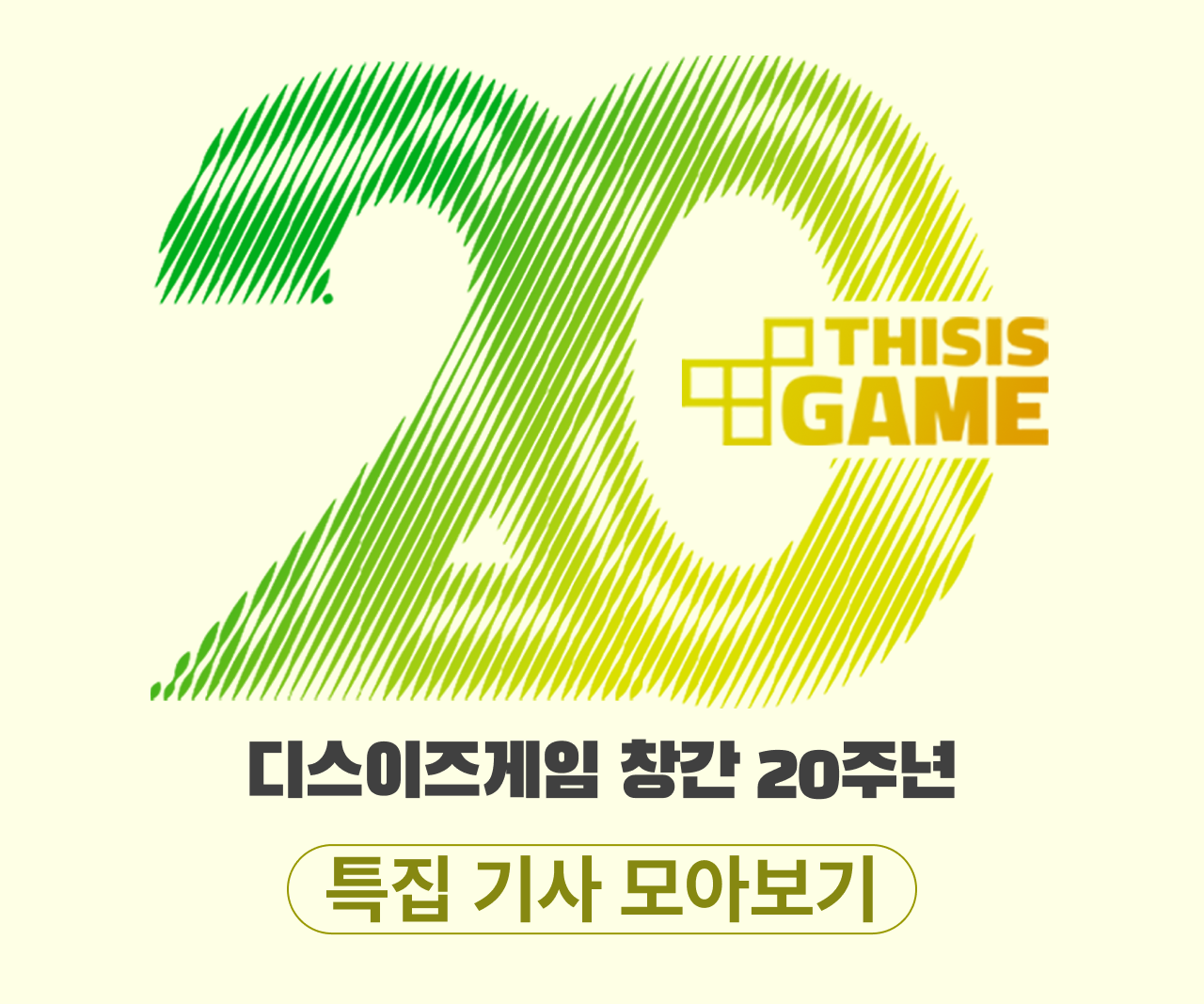"슈바ㅋㅋㅋ"가 무엇인지 아는가?
"슈바 ㅋㅋㅋ"는 넥슨의 MOBA <슈퍼바이브>의 메인 광고 문구였다. 지하철역에 광고를 꽤 오래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구는 기자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다. 한때 2호선 선릉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며 '그래서 슈바가 뭐지?' 싶었다. 이 광고 문구는 맥락 없이 다가와서 게임과 연결되지 않았다. 기자 생각인데, "슈바ㅋㅋㅋ"는 그다지 성공한 광고 문구가 아닌 것 같다.

"슈바ㅋㅋㅋ"
광고가 잘 된다고 해서 게임이 잘 되는 건 아니다. '스타로드' 크리스 프랫은 지난 2018년 "포륀이들"을 외치며 한국 게이머 자존심을 긁었다. "포륀이들" 유행어는 "슈바ㅋㅋㅋ"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포트나이트>는 한국에서 고배를 마셨다. 게임이 전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데, 까다로운 한국 게이머들 성에는 차지 않았다. <포트나이트>가 UGC 플랫폼으로 거듭나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쪽은 한국에서 매시브 마케팅 한 번 안한 <로블록스>가 강자다.
연예인 광고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지고 중국에서 온 인터랙티브 광고가 질리게 걸리는 요즘, 최고의 게임 광고로 회자되는 작품을 생각해 본다. 돌고래유괴단이 만든 <연극의 왕>. 화려한 캐스팅과 함께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아더왕 등 명작의 대사와 설정이 어우러지며 유튜브 조회수 1,100만 회를 돌파했다. <연극의 왕>이 선전했던 게임은 최근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엔픽셀의 <그랑사가>다.

"포~린이들~"에 한국 게이머들은 제대로 긁혔고, <포트나이트>를 <배그>만큼 플레이하지 않는 것으로 응수했다.

거스 히딩크도 한국에서 게임 광고를 찍었다.
가장 긍정적인 사례는 마찬가지로 돌고래유괴단이 찍은 이병헌 <브롤스타즈> 광고다. 이건 광고도 흥하고 게임도 흥했다. 재미를 본 슈퍼셀은 이듬해 <스토브리그>의 남궁민과 광고를 찍었고, 광고 대상을 전 분야로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시리얼 표지에 <브롤스타즈>를 넣어 완판시키고, 스타필드 이벤트로 인파가 몰려 수원시에서 재난문자까지 띄웠다. 이들은 최근 두산베어스와 협업해 어린이날 콜라보레이션 행사까지 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략 이런 사분면을 상상할 수 있다.
ⓐ 게임 잘 되고, 광고도 잘 됨 (best)
ⓑ 광고 도움 없이, 게임 잘 됨
ⓒ 광고는 잘 됐지만, 게임 안 됨
ⓓ 둘 다 안 됨 (worst)

<그랑사가>의 <연극의 왕>은 몰맥락한 연예인 광고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그랑사가>는 <연극의 왕>의 명성을 넘지 못했다.
그렇지만 결국 광고는 광고일 뿐이다. 어떤 광고가 '남의 돈으로 예술활동'을 하건 '게임의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켜서 KPI(전환률, 클릭률, 인지도...)를 달성'하건, 결국 결정권자는 사장님과 임원진 아니겠나? 바로 이 점에서 기자는 전반적으로 한국 게임 회사의 미적 감각이 점점 늙고 있다고 느낀다.
본지의 베트남 특집 기사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한국 주요 게임사 12곳의 대표 17명의 평균 연령은 52.4세다. 10년 전에는 42.3살이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과 프로듀서들도 함께 나이 들고 있다. 고백하자면 TIG도 젊지 않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디스이즈게임은, 20년 된 사장이 직접 기사를 쓰는 지독한 매체다.
광고는 광고일 뿐이다. 진짜로 중요한 건 알맹이, 즉 게임이다. 지난해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호연>을 하면서도 기자는 감각의 노쇠를 직감했다. 게임에는 "놀 줄 아는 놈인가"나 "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옛날 유행어가 배치되어 있었다. 게임 스토리는 평일 낮에 방영되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처럼 진행됐다. "놀 줄 아는 놈"은 2010년대 밈이고, "차가운 도시 남자"는 2008년 웹툰에 등장한 유행어다.
밈의 소비 주기가 1개월 단위로 바뀌는 지금 UGC보다 몇 배나 느린 속도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유행을 좇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일인데, 이러다가 2026년 쯤에 출시할 게임에다가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하는 건 아닐까? 설마 '퉁퉁퉁…'이 뭔지 모른다면?

<호연>의 컷씬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었다.
이제 인정하자. 게임 업계의 결정권자는 이른바 'MZ'에게 소구력을 갖추기에는 너무 늙었다. 물론 늙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도 있던가? 함께 늙어가며 재밌게 놀면 된다. 작년 게임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벤트는 넥슨이 추억의 축구선수를 대거 한국으로 초빙해 펼친 '아이콘 매치'였다. 부상으로 못 뛸 줄 알았던 박지성이 후반전 깜짝 투입될 때 기자는 살짝 울었다.
그러나 기자는 Z세대에게 한국 게임이 TV조선 <사랑의 콜센타>처럼 느껴질까 걱정이다. 게임사 대표 연령이 50대에 도입했다는데, 2024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46세다. 그렇다면 주어진 길은 둘 중 하나 아닐까? 함께 어깨 걸고 늙거나, 뛰어난 암묵지를 보유한 젊은 사람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주고 한 발짝 물러서거나. 기자는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므로 새로운 유입이 언제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디스이즈게임
디스이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