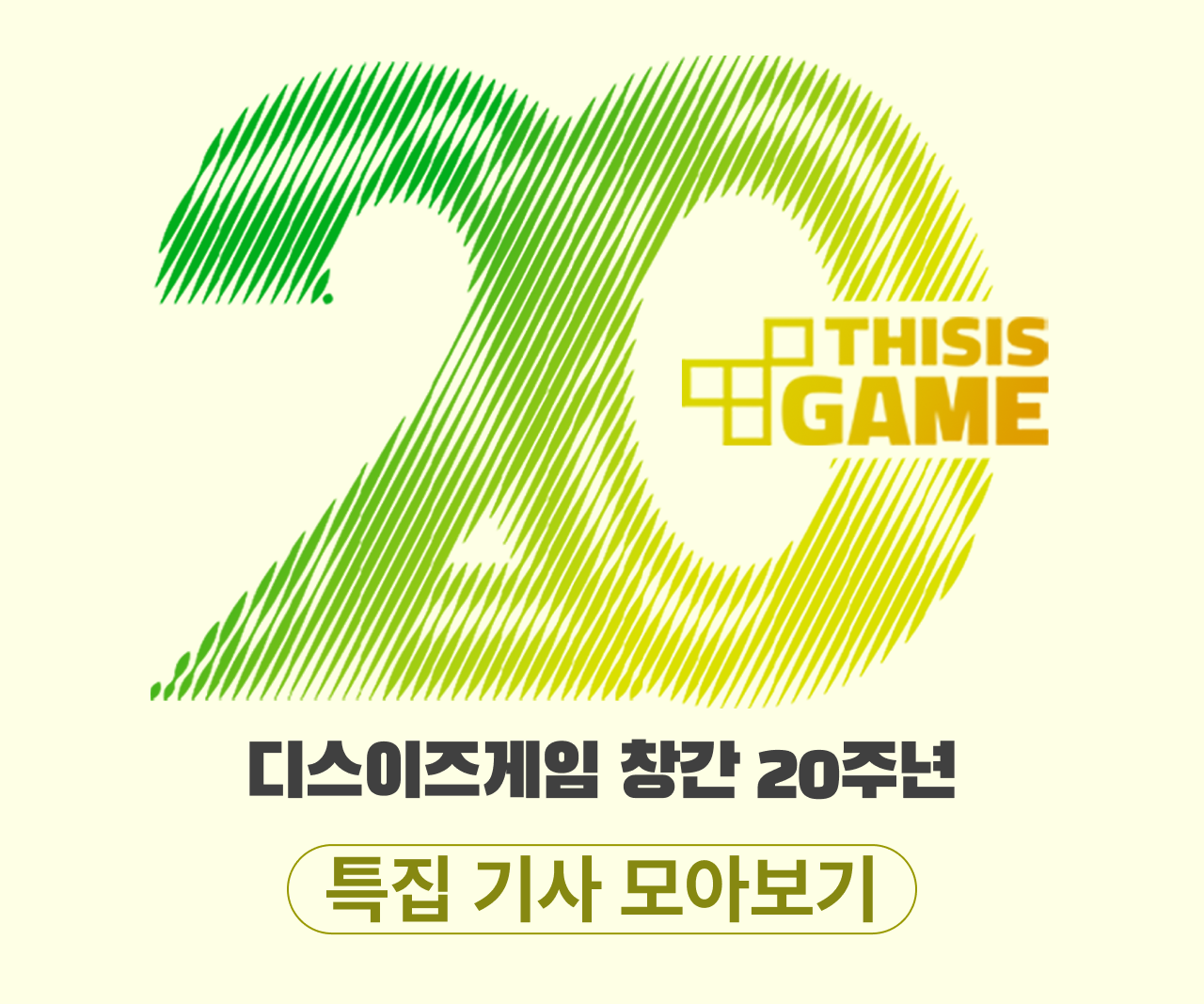아울러 <인조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 WASD로 직접 심을 조종하는 기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스마트 조이' 등 다양한 요소를 만날 수 있다. 기술적 진보에서 오는 강점을 EA와 맥시스가 아닌 크래프톤이 선취했다는 점은 일면 흥미롭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플레이하면 할수록, 기자는 '근본'이 추구하던 바를 찾고 싶어졌다.
그래서 지난 주말 홀린 듯 스팀에 22,000원을 내고 <심즈> 레거시 컬렉션을 구매했다. 본편과 모든 확장팩이 포함된 합본이었다. 마침 <인조이>가 인기리에 서비스 중이고, <심즈> 또한 그 역사가 25년이 되었으니 게임을 하며 나온 생각을 두서 없이 정리해 봤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심즈>. 아래에는 "관심 있는 인체 부위를 균질화 하는 중"이라고 쓰여있다.
나이를 먹고 다시 접한 심즈는 단순한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풍자적 메시지가 이제야 보였다. 소비자본주의를 디스토피아처럼 묘사하며, 인간의 욕망과 물질주의의 허무함을 꼬집는 게임이었다.
게임에 접속하면 괜히 마음이 편해진다. 배경음악 덕분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심즈>의 BGM을 시리즈 최고로 꼽는다. 고급스러운 스트링 선율과 보사노바, 그리고 스무스 재즈는 플레이어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대형 쇼핑몰에 들어온 것처럼 '지르고' 싶은 욕망이 샘솟는다. 그러나 물건 설명을 읽다 보면 이 편안함에 균열이 생긴다.
'구매 모드'의 카탈로그에는 날카로운 문장들이 구매 모드에서 고민하는 플레이어를 비꼬고 있다. 일본식 부채는 "서구인의 구미에 맞게 특별 제작"되어 "당시 전통적인 일본 부채와 거리가 멀다"고 소개된다. 초상화는 "그 진실성만으로도 뜨끈뜨끈한 투자 대상"이라고 한다. 흑백TV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약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비싼 칼라 TV를 원하겠는가?"라고 적나라하게 쓰여 있다.

<심즈>의 식민지 풍 차 세트. "제국은 왔다가 가지만, 찻잎은 영원히 남는다. 이제 제국의 차는 모두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공급이 충분한 한도 내에서는 말이다..."
게임 자체도 대단히 염세적이다. 아끼던 심이 죽으면 "가엾기도 해라!"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전화로 사교 바로미터를 올리려 하면 "당신은 집에서 편안히 놀아 좋겠지만 가엾은 OO는 돈 벌러 갔습니다"라고 꼬집는다. 잠든 밤에는 대뜸 "냉장고를 열어보라"는 장난전화가 걸려 오거나, 도둑이 들어와 비싼 자산을 훔쳐 가기도 한다. (이 도둑 기능은 <심즈 4>에서 최근 부활했다.)
이밖에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상당히 많았다.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심도 장난전화를 해서 경찰을 집으로 부를 수 있다. 욕구 불만 상태로 심을 망쳐버리면 이벤트로 "슬픈 어릿광대"가 나타나 계속 플레이를 방해한다. 파티용 케이크를 구매하면 댄서가 나와서 심들 앞에서 제법 야한(...) 춤을 춘다. 그 쇼에 빠진 심은 일시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플레이어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요상망측한 플레이는 1편부터 줄곧 존재했다. 사신과 사랑을 나누어 사신의 딸을 낳는다거나, 심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거나, '공식'이 제공하지 않는 여러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한 모드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공식'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비꼬고 플레이어를 약 올리는 대범함은 오직 1편에서만 빛을 발하는 듯하다.

댄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취소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뭔가 알 것 같기도.

심의 욕구 바로미터가 낮아지면 광대가 나타나서 심을 따라다닌다. 화장실까지 따라다닌다.

힘내요 여보 ^^
<심즈>에서 돈 치트키는 'rosebud'다. 이 치트키만 입력하면 무한한 돈이 생겨나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다. 이 치트키 이름은 영화 <시민 케인>(1941)의 '로즈버드'에서 따온 것이다.
영화에서 '로즈버드'는 주인공 찰스 케인의 유언으로,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어린 시절의 행복과 순수함을 상징한다. 케인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았지만, 결국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다 죽는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타고 놀던 썰매였던 것이다. 평론가들은 '로즈버드'를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한 경고,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 또는 삶의 미스터리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한다.
게임 속 'rosebud' 치트키도 마찬가지다. 무한한 돈으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심들의 행복은 결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심들은 사교 관계와 감정적 교류 없이는 만족하지 못한다. 가족 없이 홀로 있는 심은 사교 바로미터를 채우기 가장 어려워하며, 이는 플레이어에게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좌상단 치트 화면. rosebud만 있으면 돈이 복사가 된다
'심' 시리즈를 창조한 윌 라이트가 직접 'rosebud'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다. 대신 최근 그는 뉴욕타임스의 <심즈> 25주년 인터뷰에 출연해 "당신은 게임의 모든 것은 구매한다. 냉장고, TV, 모든 것들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은 고장 나기 시작한다"고 게임에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 케인>에서 '로즈버드'의 정체는 영화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 케인이 죽은 뒤, 인부들은 그의 컬렉션을 정리하면서 값이 나가는 물건은 따로 모아두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벽난로에 태워버렸는데 그 안에 영화와 주인공이 그토록 찾던 썰매 '로즈버드'가 함께 소각된다. 신문 사업가 케인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던 수집품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 가고, 그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썰매만이 그와 함께 연기 되어 사라진 것이다.

최근 레딧에서는 "<심즈 4>는 <심즈>가 조롱하던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필자는 초창기 맥시스가 추구하던 <심즈>의 블랙 코미디 성격을 소개한 뒤에, 반대로 최근의 게임(심즈 4)은 "매끈하고, 기업적이고, 안전하고, 세련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삭막"하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심즈 4>는 흡사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나 핀터레스트 게시판처럼 느껴진다"며 "<심즈>는 무언가에 대한 게임이었지만, <심즈 4>는 더 많은 DLC를 구매하도록 하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의 필자는 오늘날의 <심즈 4>를 "완벽하게 연출된 쇼룸"이라고 말한다.
과거 윌 라이트가 비판했던 소비자본주의의 첨병들은 앞다투어 '심즈' 시리즈를 "쇼룸"으로 사용 중이다. 그간 H&M, 이케아, MAC, 구찌 등의 브랜드 제품이 게임에서 홍보됐다. <인조이>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다. 게임에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삼성전자의 갤럭시 태블릿, 엘지전자의 스탠바이미가 배치되어 있다. 얼리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주얼리 제품과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게임에서 브랜드 제품을 즐기는 게 재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초창기 <심즈>에서 라이프 시뮬레이션의 피로, 소비에 대한 갈망 따위는 풍자와 과장, 해학으로 지속력을 찾았다. 그러나 요즘 이 골계미(滑稽美)의 자리는 점점 DLC와 PPL이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도전자가 적극적으로 "쇼룸" 역할을 자처하는 지금, 25주년을 맞은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에 '로즈버드'적 각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인가?

<인조이>의 스탠바이미

<심즈>의 '엔지' 플라즈마 티비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디스이즈게임
디스이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