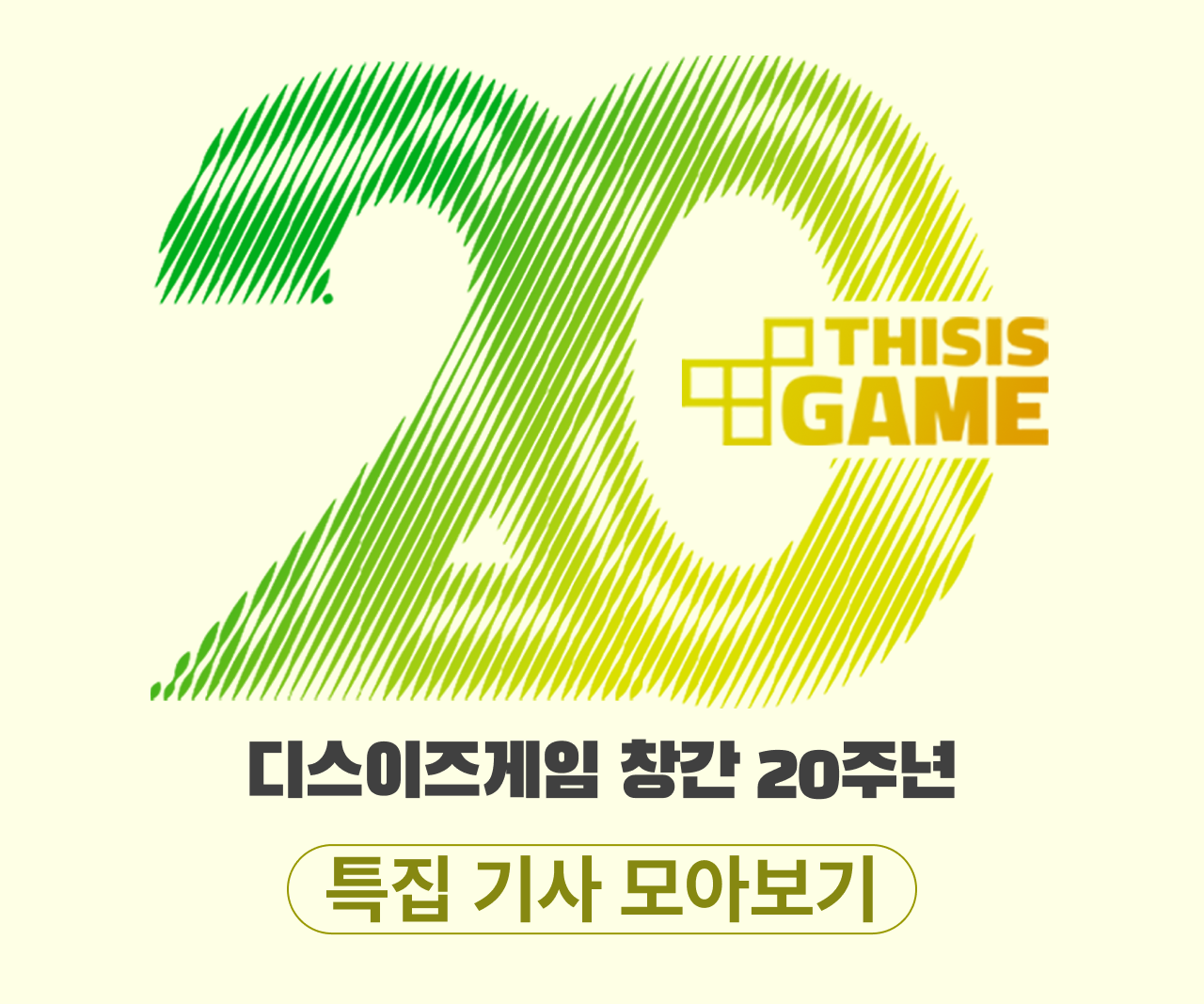2025년 5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굴까?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그렇게 내지를 줄이야. 사업적으로 보면 누굴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빼놓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거다.
이 세 사람에게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셋 모두 베트남 정부와 만나 대규모 투자를 논의하거나 결정했다. 대형 리조트,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AI 연구개발(R&D) 센터까지 각자 투자 영역은 달랐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베트남을 향했다.
이 거물들은 왜 지금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할까? 한국 게임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디스이즈게임 시몬(임상훈 기자)
[TIG 베트남 특집]
절호의 기회, 또 놓칠 것인가? 베트남 게임씬에 주목하자 (바로가기)
트럼프, 머스크, 젠슨 황이 베트남을 애정하는 이유
베트남은 어떻게 아세안 최고의 게임 강국이 됐나 (바로가기)
게임 산업의 황금 파트너십! 한국의 경험과 베트남의 젊음이 만난다면 (바로가기)
베트남 게임 책임자 최초 인터뷰 “한국 게임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 (바로가기)
베트남 북부 부동산 MOU를 체결한 트럼프
트럼프는 ‘이권에 민감한’ 사업가다. 그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트럼프 그룹’(The Trump Organization)은 대선 유세가 한창인 때에도 ‘개인 사업’을 결코 미루지 않았다. 2024년 9월 25일,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 15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를 투자해 골프장과 호텔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선거운동으로 바빴을 트럼프 본인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만큼 베트남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이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당선 후에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의 탈중국화를 촉진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은 최적의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바다와 접해 있어 물류와 무역이 용이할 뿐 아니라,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19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강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플, 삼성전자, 인텔, 폭스콘, 나이키, 갭, UE 체어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했고 중국 제조업체들도 뒤따랐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전자제품 양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 베트남 GDP 성장률은 7.09%였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목표를 8%로 설정했다. (한국은 작년 2%였다. 올해는 0%대가 예상된다. 국책기관 KDI는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GDP 성장률이 0.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브스는 트럼프 2기 때 베트남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2기는 어떻게 될까? 탈중국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포브스’는 지난 연말 기사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 하에서는 ‘Made in China’가 ‘Made in Vietnam’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를 올리면서도 트럼트는 베트남을 꼭 짚어 이렇게 말했다.
"Vietnam, great negotiator, great people. They like me, I like them.”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다. 기부금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이었고,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매일 1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덕분에 트럼프 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된 그는 트럼프 집무실과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칼날을 휘둘렀다. 트럼프와 행보를 같이 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유사해진 것일까? 머스크 역시 트럼프처럼 베트남에서 큰 기회를 포착했다.
여기저기 빌딩을 세웠던 트럼프는 땅에 욕심을 냈지만, 우주선을 날렸던 머스크는 하늘을 주목했다. 2024년 9월 27일,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베트남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화가 안된 농촌 지역까지 인터넷을 커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투자 금액까지 트럼프와 동일한 15억 달러였다.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한 머스크
베트남은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최근 GDP 성장률은 태국의 3배 수준이고, 2030년 GDP는 태국을 역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약 1억 명의 인구 중 75%가 35세 이하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MoMo(골드만삭스 투자)나 VN페이(손정의 투자)가 급성장하며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GDP 상승 등에 따른 구매력 성장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스타링크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스타링크가 농촌 지역까지 인터넷을 보급하면,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바야흐로 생성형 AI의 시대다.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에서 70~95%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한 독점적 지위 덕분에 엔비디아는 애플과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 지위를 다투고 있다. 올해 1월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의 주인공도 단연 젠슨 황이었다. 그의 한 마디에 K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업체의 주가가 요동쳤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그는 2023년 말부터 베트남을 ‘엔비디아의 제2의 고향’(Nvidia's second homeland)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젠슨 황의 고향은 대만이다. 하지만 그는 베트남을 '엔비아의 제 2의 고향'이라고 부른다.
시장 기회에 주목했던 트럼프, 머스크와 달리, 젠슨 황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베트남의 인재들이었다. 2024년 12월 5일, 젠슨 황은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AI 자회사, ‘빈브레인’을 인수했다. 이는 2006년 네이버의 ‘첫눈’ 인수, 2014년 구글의 딥마인드 인수와 유사한 패턴이다. 두 인수 모두 인재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큰 성과를 거뒀다. 첫눈의 핵심 개발자 신중호는 2011년 ‘라인’ 개발을 주도했다. 딥마인드 개발자들은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펼친 알파고를 만들었고, 그 수장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지난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개발로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젠슨 황은 단순히 특정 팀 인수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수준으로 베트남을 "엔비디아의 제 2의 고향"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베트남에 AI 연구개발센터와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까지 밝혔다. 이 연구개발센터는 베트남 프로그래머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1986년에야 뒤늦게 개혁개방을 시도한 베트남은 어떻게 이런 글로벌 인재 풀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유교적 전통이 강한 국가다. 1075년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1919년까지 844년간 시험을 봐서 국가 인재를 선발했다.
한국과 유사하게, 성공을 위해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다. 2022년 한국의 허준이 교수가 필즈상(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아 화제가 됐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미 2010년에 응오 바오 쩌우가 이 상을 수상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이 주도했던 국제 수학 및 정보 올림피아드에서도 2010년 이후 베트남 학생들의 성취가 두드러진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4.9%로,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베트남에서 IT 인재가 두드러지는 데에는 국제 경제 환경과 국가적 전략의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이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옆 나라 중국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 베트남은 스프트웨어 개발 같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IT 인재가 많은 것과 같은 이유다. <위쳐>, <사이버펑크 2077>, <디스 워 오브 마인> 같은 글로벌 히트작이 폴란드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게임 강국으로 급부상한 폴란드의 게임들
폴란드는 유럽에서 IT 아웃소싱 최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베트남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2023년 기준 인도, 중국에 이어 IT 아웃소싱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수를 감안하면 인도와 중국을 뛰어넘는 경쟁력이다. IT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IT 아웃소싱 업체의 주요 고객이 됐다. 일본무역진흥청(JETOR, 2019)에 따르면, 일본에서 고용된 외국인 IT 개발자 중 베트남 국적이 21%로 인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도 베트남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것이다. 라인은 2017년 베트남 개발사를 인수해 ‘Line Vietnam’으로 사명을 바꾸고 호치민시와 하노이에서 개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스마일게이트도 사내 IT 인프라 개발에 베트남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근면성실한 유교 한자 문화권인 동북아 문화, 180여 년 간의 프랑스 지배 하에 형성된 유럽식 사고와 새로운 문물에 대한 선호,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유연성이 잘 버무려져 있는 곳이 베트남”.
베트남 취재에 큰 도움이 된, 유영국 작가가 쓴 <베트남 라이징>에 나오는 문구다.

베트남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바일게임 초창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플래피버드>가 하노이에서 나오고, NFT게임 붐을 이끌었던 <액시 인피니티>가 호치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외에도 게임 그래픽 아웃소싱 분야도 베트남의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이다. 글래스에그는 <포르자> 시리즈와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 등 유명 레이싱 게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덕분에 2022년 세계적인 그래픽 아웃소싱 업체 버추어스에 인수됐다. 스팍스(Sparx*)는 <콜 오브 듀티>, <폴아웃>, <아웃 오브 아너> 등 세계적인 게임에 참여했다.
베트남은 아세안 최고의 게임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 개발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게임사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제 베트남은 단순한 시장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서도 가치가 있다. 젠슨 황처럼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좀 더 알아야 한다. 베트남은 어떻게 아세안 최고의 게임 강국으로 부상했을까?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디스이즈게임